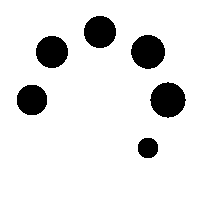티스토리 뷰
목차
이 글은 한 개인의 실직 이야기를 통해 현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히스테리시스 효과, 그리고 자동화 시대 인간 노동의 위기를 다룹니다.
만수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구조적 변화 속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그리고 충격
만수는 25년간 제지회사에서 근무해 온 성실한 직원이었다.
동료들 사이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통했고, 정년까지 무난히 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경영진의 한마디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만수는 그 대상이 되었다.
실직 소식은 한순간이었고, 이후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만수는 석 달 안에 재취업하겠다고 결심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재취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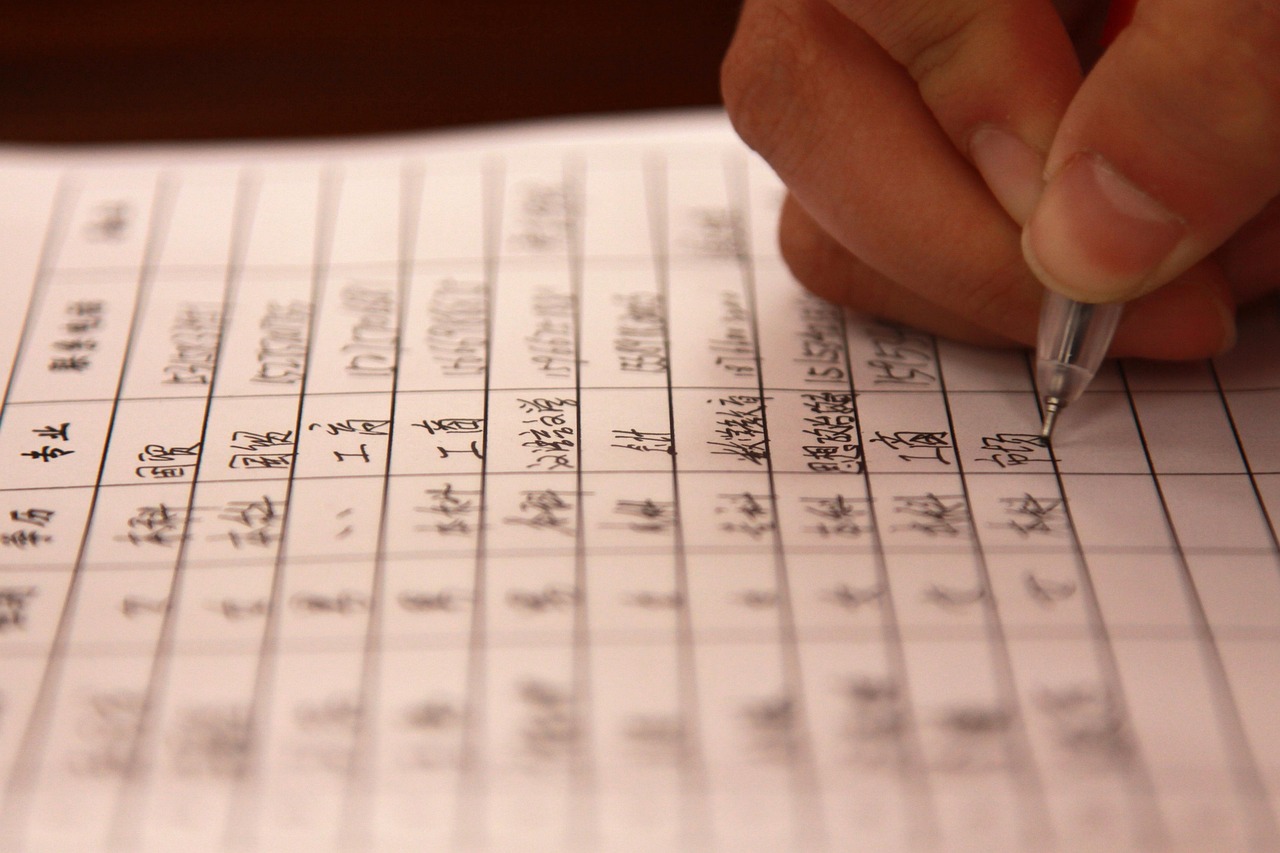
재취업의 벽 — 히스테리시스 효과란?
경제학에는 **‘히스테리시스 효과(Hysteresis Effect)’**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한 번 실업 상태에 빠지면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1986년,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Blanchard)**와 **로렌스 서머스(Summers)**는 이 효과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그들은 “경기가 회복되어도, 고용률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바로 ‘내부인과 외부인 문제’ 때문이다.
- 내부인: 이미 고용된 사람들 → 경기 회복 시에도 해고되지 않음
- 외부인: 실직자나 구직자 → 신규 채용에서 밀림
즉, 만수처럼 한 번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은 다시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은 낡고, 자신감은 줄어들며, 사회는 그를 점점 더 외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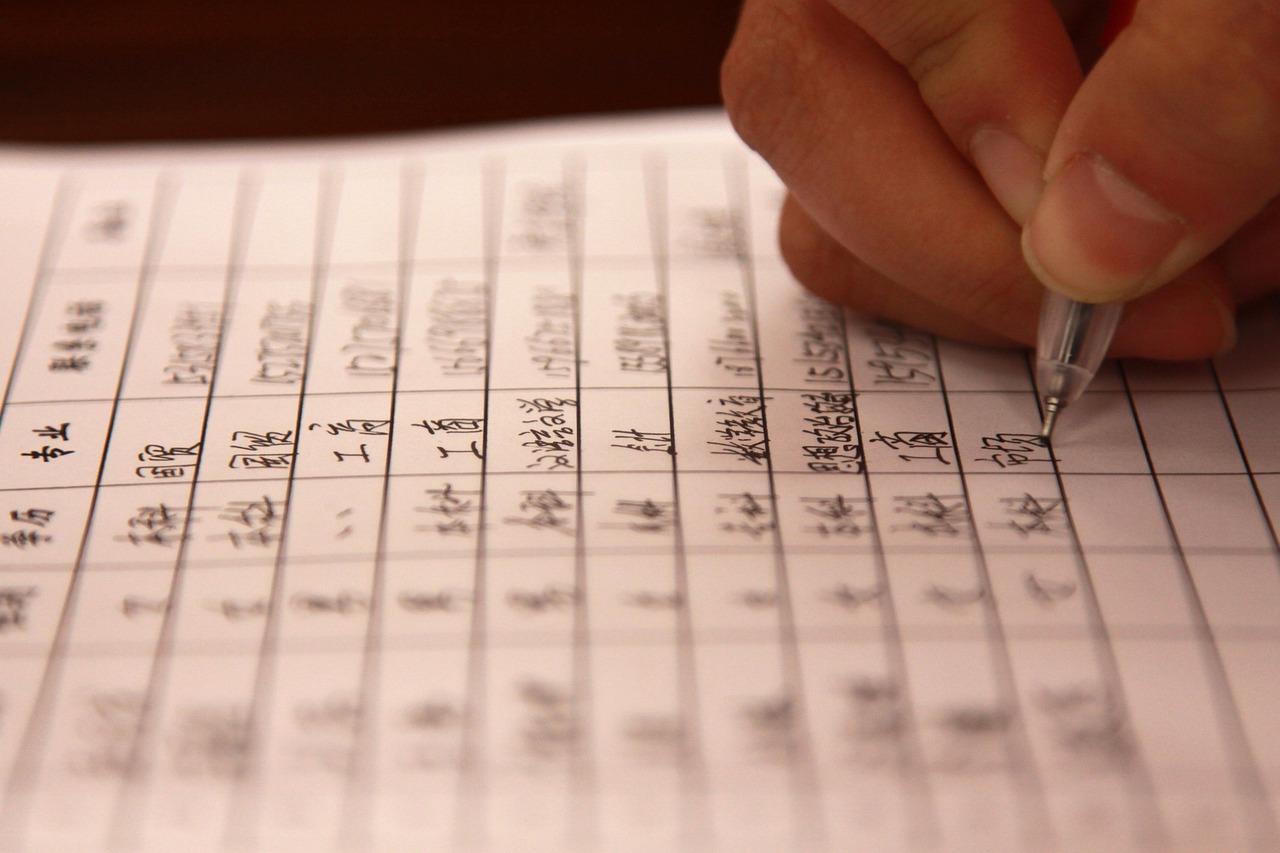

제지산업 불황과 고용의 현실
만수가 속했던 제지산업은 이미 구조적 불황에 접어든 지 오래였다.
디지털화, 종이 사용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인수합병의 여파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을 택했다.
실직자는 늘어나고,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졌다.
만수의 말처럼 “당신이 사라져야 내가 살아”라는 냉혹한 경쟁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처럼 산업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결합하면서,
히스테리시스 효과는 개인의 삶에 현실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새로운 시작, 그러나 로봇이 먼저였다
오랜 구직 끝에 만수는 ‘문제지’라는 회사에 입사했다.
겉으로 보기엔 제지회사지만, 운영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이곳은 인공지능(AI) 로봇이 모든 공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만수는 그 속의 유일한 인간 노동자였다.
로봇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공장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된다.
기술 발전은 분명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대체 불가능한가?’라는 두려움을 안겨준다.
그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퇴직까지 살아남겠다.”
그러나 그 결심 뒤에는 AI 시대 인간 노동자의 불안과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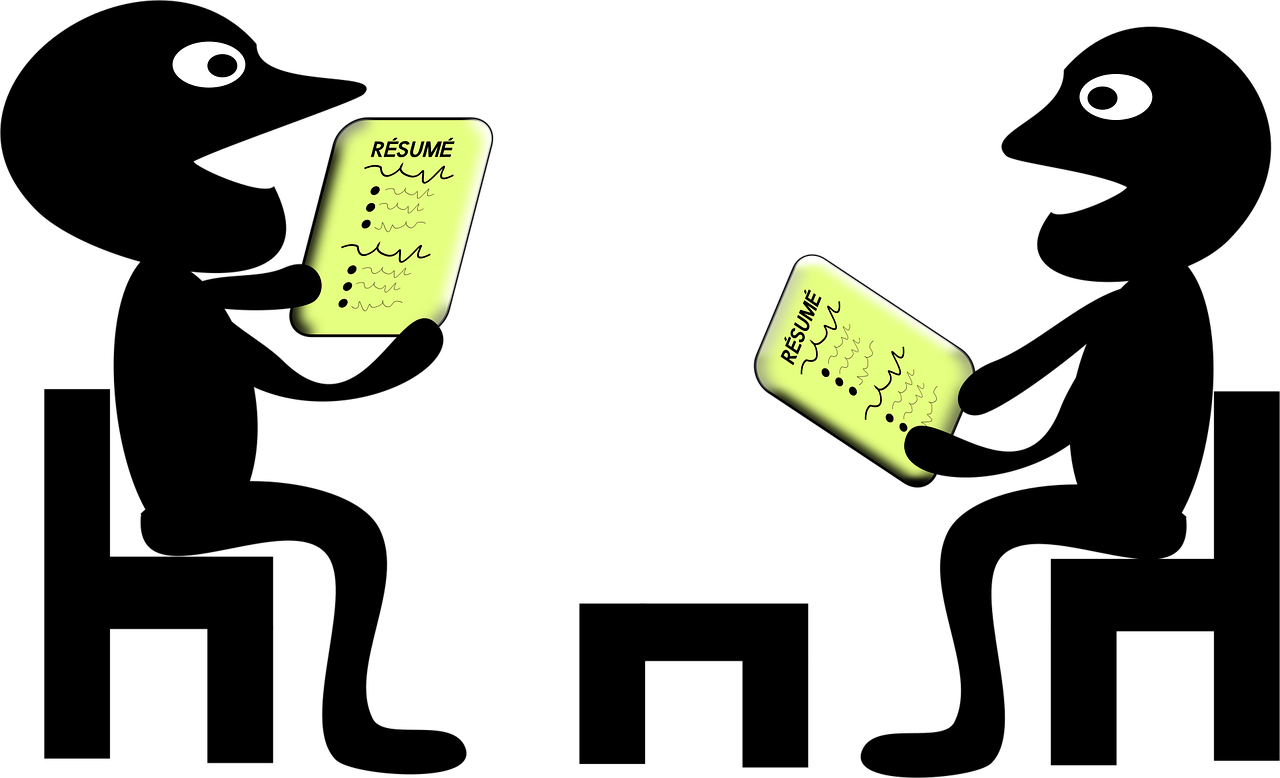
실직 후의 삶이 진짜 시작이다
만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질문이다.
“우리는 언제든 실직할 수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히스테리시스 효과는 단지 경제학 용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내일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장기 실직자에 대한 직업 재교육 및 정부 지원 강화
- AI 및 자동화 산업 속 인간 중심의 일자리 설계
- 개인의 경력 전환과 기술 업데이트를 돕는 사회적 시스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아니다.
만수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운다.


AI와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
“만수는 왜 다시 일할 수 없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의 질문이다.
히스테리시스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일하는 인간”의 의미를 지켜내는 사회만이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